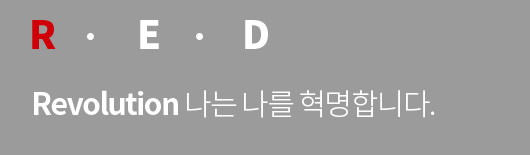
-

- 커뮤니티
- 레드나눔방
- 레드칼럼
커뮤니티
레드칼럼
레드 칼럼 56 :그래, 수업의 주인은 너희들이야!
오작교
315 0 16-10-28 20:53
띠리링~ 종이 울린다. 바로 50분 전체 수업에 40분이 흘렀다는 예비종소리이다. 우리 학교는 40분 수업에 10분 복습을 전체 수업내용으로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수업이 40분이 지났다는 예비종이 울리면 코치는 선수들에게 40분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시키고 확인하는 10분을 가진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도 설명되듯이 배운 내용을 바로 복습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잊어버린다는 뇌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 시스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뇌를 단련하여 복습주기를 구현한 수업시스템이 잘 적용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그 한계도 있었다.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도, 하고 싶은 적도 거의 없는 아이들에게 동기 부여를 시키는 것과 학습을 어떻게 익히는지에 대한 배움의 기술이 쉽게 익혀지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수업 내용을 재미있게 쉽게 이해시키고 암기시키기 위해 참 많이도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을 찾기란 항상 저 멀리있는 별을 따는 방법만큼이나 멀게만 느껴졌다. 그렇다고 한 명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수업을 하는 나에게 있어 떠나지 않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이였다. 1주일에 2번씩 쪽지시험을 보면서 확인도 해보고 프로젝트 수업을 해서 다양한 각도로 수업을 맛보게도 해보고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학습 내용을 반복하도록 성실하게 꾸준히 하도록 도와도 봤지만 몇 명의 선수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나 성실도가 쉬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중간고사 학습코칭 이후 그동안의 고민을 수업에 적용시켜 보기로 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코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강의를 준비하려고 누군가에게 재미있게 쉽게 설명하려고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이였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 원리를 선수들도 익히게 해보자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몇 명의 선수들이 대번 투덜댄다. “문법이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강의를 준비해요?” 그런 그들을 다독이며 “1달간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보자. 하다보면 점점 늘게 되고 누군가에게 설명하다보면 자신이 뭘 모르는지 왜 원리가 그런지 알아차리게 된단다. 그리고 잘하는 친구에게 코치에게 물어가면서 하다보면 점점 잘하게 될거야.”라고 설득하며 달래며 15분 정도 분량의 강의를 준비해오도록 시켰다. 주로 파워 포인트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유도하며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들을 팀으로 묶어 강의를 준비시키고 잘하는 아이만 강의하게 될까봐 무작위로 강의를 돌아가면서 시켜보았다. 처음에는 준비해온 자료에 오타도 많고 파워포인트도 다루기 힘들어하고 영타도 느리고 무엇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앞에 서서 발표할라치면 우물쭈물대고 말은 더듬고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아이도 있고 가지각색이였다. 속으로 ‘아~ 그냥 내가 할까? 강의가 너무 형편없다. 속이 쓰리고 뒤집힌다. 괜히 이렇게 하자고 했나? 몇 명은 되는데 역시 몇 명은 정말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도 아냐, 믿고 맡겨보자. 인내하고 지켜보면 반드시 될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와 당부를 하곤 했다. 그런데 이러기를 3주가 흘러갔다. 그런데 서서히 아이들이 변하가기 시작했다. 서로 친구들의 강의를 듣고 보고 준비를 같이 하고 강의 요령을 계속 가르쳐보니 자기들의 위치를 빠른 속도로 찾아가고 있고 긴장하면서도 나름 무척 즐기는 아이도 늘어가고 있다. 말하는 법, 시선처리, 적절히 선수들과 질의 응답하는 법, 수업을 깊이 숙지하지 못하면 한 마디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선수들이 알아차려가는 것이였다. 요즘엔 자주 놀랜다. ‘아니 저렇게 잘 준비하다니, 이런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우와 저 선수는 참 정성스럽게 준비했구나’ 이제 서서히 수업을 볼 때마다 묘한 기대감마저 생겼다. 그러면서도 한 켠에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가장 즐기던 수업을, 모든 선수들이 나에게 집중하며 한편의 드라마를 써오 듯 서온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못내 아쉽고 지금도 다시 옛날도 돌아가고픈 충동을 매번 느낀다. 강의만큼은 내 고유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묘한 고통이 밀려왔다. ‘역시 이건 아니다’ 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나만의 강의로 채우고 싶었다. 정말이지 선수가 아닌 나 홀로 강의하고 싶었다. 그러나 “코치님, 코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는 선수도 생기고 늘 뒤에서 멍하니 수업에 잘 끼지 못하는 선수가 “코치님, 제가 정말 멋지게 준비했어요. 다음엔 절 꼭 시켜주세요.”라고 말하니 “그래, 수업도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너희들이 주인이 되고 너희들이 경기를 뛰는 거야.”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이제 수업은 40분간 선수들의 것이 되었고 마지막 10분은 내가 총정리 및 주요 강의 포인트를 집어주고 끝내게 되었다. 새삼 다시 코치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코치는 그저 경기장 밖에서 경기를 잘하도록 돕는 존재. 경기장의 모든 시합과 그 영광은 선수들이 누리도록 하는 존재. 선수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계속 연구하고 적용하는 존재라고... 레드코치 오솔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