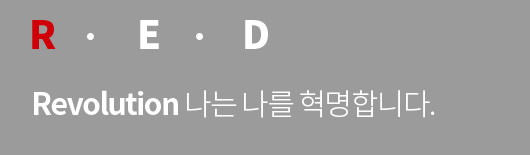
-

- 커뮤니티
- 레드나눔방
- 레드칼럼
커뮤니티
레드칼럼
레드 칼럼 108 부모님을 이해한다는 것
오작교
461 0 16-10-28 23:29
우리는 부모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해하고 있기는 한걸까요? 철없이 부모님께 짜증을 부리는 선수들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순간순간 저의 모습을 발견하여 뜨끔하고는 합니다. ‘부모님께 잘 해야지’라고 부모님 생신에 다짐을 하고, 어버이날 다짐을 하고, 연초에 다짐을 해도 어느 순간 흐릿하고 희미해지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참 섭섭하시겠어요. 저도 아이를 낳으면 제 아이에게 섭섭하겠지요. 처음 어머니의 키를 따라 잡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양 색깔 소리까지 기억이 나는 것을 보니 꽤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건 제가 중학교 2학년 6월 무렵이었지요. 문득 싱크대에 서 있는 어머니보다 내 키가 더 큰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이리 와봐”라고 하며 냉장고 앞에서 어머니와 등을 대고 키를 쟀습니다. 훌쩍 큰 제 키에 어머니는 놀라워 하시면서도 즐거워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키가 이만큼 컸다는 기쁨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어머니가 이렇게 작았구나...’ 제 커진 키가 아니라 어머니의 작은 키가 느껴진 것입니다. 레드 선수들은 4학년(고1)이 되면 깨어나기를 들어갑니다. 3박 4일의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아픔과 다른 이의 아픔을 꺼내고 털어낸 아이들은 키만큼이나 마음이 커져 있습니다. 경축장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큰 키의 아이들이 부모님을 쏙 안아드립니다. 부모님도 아이들도 그땐 눈물바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하기 바쁘고 부모님은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느라 바쁘십니다. 아이들의 말 속에서 저는 제가 어머니와 키를 재던 때의 마음을 떠올리곤 합니다. 키도 키지만 이젠 마음도 부모님만큼 커져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묻지 않아도 저의 중학교 2학년 시절의 제 마음과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결 같듯 자식 또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한결 같을테니까요. 선수들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절을 합니다. 마음을 담아서요. “부모님은 크십니다 저는 작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소낙비 코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