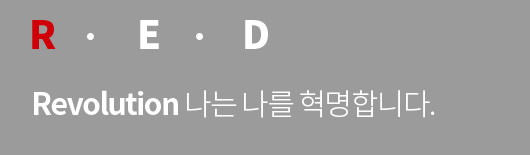
-

- 커뮤니티
- 레드나눔방
- 레드칼럼
커뮤니티
레드칼럼
레드 칼럼 177 ‘안다’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오작교
476 0 16-10-30 12:46
오늘도 저는 학교에서 제가 가장 행복해 하는 장소인 ‘조양각’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눈가에 머무는 햇볕은 어느새 가을이 왔음을 온 몸으로 제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아이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코치님 여기서 뭐하세요?” “자는 중이야” 기대했던 반응은 “에이 자는데 어떻게 말해요”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이 들려옵니다. (작은 목소리로)“야 코치님 주무신다 조용히 하자” 그리고 살금살금 제 옆을 지나갑니다. 저는 ‘뭘까? 이 느낌은’하고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어버립니다. 가끔 아이들의 의외의 반응에 작은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지난 주에는 혼을 한번 냈더니 자신들끼리 스스로 학급회의를 열어 대안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내 드는 생각은 ‘아 내가 아이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참 몰라’싶습니다. ‘노자’가 얘기를 합니다. “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 경우, 그릇으로서의 쓰임새는 그릇 가운데를 비움으로 생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아이에 대해 결론이 꽉 차버려서 작은 변화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매일 매순간 변하는 아이들에 대해 나는 언제적 ‘안다’라는 틀로 그릇의 가운데를 꽉 채우고 있을까? 아이들에 대해 ‘안다’는 결론이 아닌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모르게 판단이 비어버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에 대해 계속해서 ‘모른다’고 말을 해 봅니다. 죽을 때 까지 변해가는 아이들에게 ‘모른다’고 말하고 그러니 언제나 ‘너의 마음을 알려주렴’ 이라고 물으며 가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 변하는 자녀들에 대해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대안학교건 공교육이건 선생님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속담처럼 내려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일 몰라” 함께 ‘모른다’고 말을 하고, 그러니 알려달라고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너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좋아하는 노래는? 좋아하는 영화는?” 레드스쿨 코치들도 언제나 물으며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낙비 코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