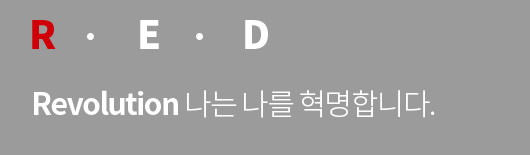
-

- 커뮤니티
- 레드나눔방
- 레드칼럼
커뮤니티
레드칼럼
2022 레드칼럼 30 -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가?
RED
330 0 22-12-13 10:23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였다. 평소엔 모임에 적극적이지 않던 도열이가 이번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안산에 사는 재욱이네를 가자고 했다. 모인 친구들은 도열이네 부부(도열이와 주희씨), 재욱이네 부부(재욱이와 현경씨) 그리고 나였다. 나를 제외하곤 신혼부부들이다보니 만나면 보통 아기 이야기를 하게 된다.
“돌림자를 ‘재’를 써야 해서 아들이면 뭐라고 이름 지을지 생각중이예요.”
주희씨는 3개월 후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계속 생각중이었다. 도열이 성이 ‘노’이기에 친구들은 온통 장난치기 바쁘다.
“노재미로 해~” / “아니다 노재수로 해.”
이름 짓는 일이 신중한 일일 텐데 친구들에게 물으면 큰 도움은 안된다. 그렇다고 진지하게 고민에 응해준다 한들 그대로 이름 짓지도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결국 어디 작명소에서 짓거나 부모님들께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 재욱이의 갓 100일 지난 아들 대환이가 잠에 들려 했다. 아이 재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보니 재욱이네는 다급해졌다.
“대환이 아빠 애기 이불 좀”
방안에서 현경씨가 재욱이를 불렀다. 그리고 재욱이는 방에 들어가 5분 뒤 아이를 재우고 나오며 웃으며 말했다.
“아이 낳으면 이름이 바뀌어.”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노인과 바다> 중
소설 속에서도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붙여진다. 그러나 명명되는 순간 그 인물이 살아나는 건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도 같다. 많은 소설 중 가슴이 찡한 인물이 떠올랐다. 『노인과 바다』이다. 그러고보면 헤밍웨이는 참 인간미가 떨어지는게 아닌가. 분명 『위대한 개츠비』처럼 떡하니 이름을 제목에 붙여줄 법도 한데 굳이 ‘노인’이라 명명(命名)한다. 노인 입장이 되어 본다면 ‘저기 아저씨’라거나 ‘야’라는 말로 나를 부르는 느낌일거다. 나는 그 이름을 기억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짓듯이 분명 정성스레 지어진 이름이 있을테다.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늙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고, 바닷빛이며 명랑하고 패배를 몰랐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조각배를 끌어올린 곳에서 둑을 같이 올라가면서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노인과 바다> 중
‘산티아고’. 나는 소년에게서 처음 노인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소설 속 인물을 익명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많다. 『어린왕자』도 그렇다. 하지만 ‘노인’으로 명명되는 그래서 만나는 어떤 운명과 싸우는 건 참으로 힘겨울 거다. 노인이란 그런 존재니까. 무엇이듯 이길 거 같던 젊음의 시절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찾아오는 겨울과 같은 거다. 그래서 나는 노인이 다시 ‘산티아고’라 불리길 바라고 있었다. 이름은 친구 재욱이 말처럼 바뀌고 바뀌는 거니 말이다.
[밤새도록 승부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검둥이에게 럼주를 먹이고 담배를 물려주었다. 술을 마신 다음 검둥이는 사력을 다해 안간힘을 쓰더니, 노인을, 아니 그때는 노인이 아니라, 산티아고 선수의 술을 거의 3인치 가량 눕혔다. 그러나 노인은 죽을힘을 다하여 다시 맞선 생태로 손을 세웠다. 그때 노인을 잘 생긴 우수한 운동가인 검둥이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다.] <노인과 바다> 중
당연히 질 거 같은 승부에서 노인은 ’산티아고 선수‘로 명명된다. 나이로는 노인일지 몰라도 이 승부에서는 노인이라 부를 수 없었을 거다. 그의 이름은 노인으로 정지된 것이 아닌 ’산티아고‘였다. 참 신나는 일이다. 그 전까지 알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만난다는 건 말이다. 그러니 안다고 쉽게 판단을 멈출 수 있겠는가? 산티아고에게 84일간 고기를 못잡았으니 ’살라오‘에 ’노인‘이라고 쉽게 이름 붙일 수 있을까?
산티아고는 바다로 나갔다. 그리고 거대한 청새치를 잡았다. 끈질긴 싸움에서 결국 승리를 했다. 비록 돌아오는 길 상어에 의해 모두 잃고 청새치는 뼈만 남았지만 그건 별개의 일이다. 중요한건 산티아고는 청새치를 잡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거다.
[그때 저쪽 길 위에 있는 판잣집에서 노인은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아직도 얼굴을 파묻은 채 엎드려서 잠을 잤다. 소년은 가만히 곁에 앉아서 노인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노인과 바다>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산티아고는 스스로 '노인'이라 붙여지는 이름을 들으면 어땠을까? 남이 무어라 불러주건 스스로 젊은 눈빛을 빛내지 않았다면 그는 검둥이와의 팔씨름을 시도도 못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84일간 잡지 못한 고기를 다시 잡겠다고 바다로 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노인이란 나이가 젊건 많건 스스로 빛내지 못할 때 붙는 이름이었다. 이름은 단순한 ID가 아니다.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로 살아있는 정체성이다. 그래서 TV속 아이돌들은 이름 짓기에 그렇게 필사적이다. 대중에게 기억되고 싶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게임 속 캐릭터 이름을 짓기에 그렇게 필사적이다. 그런 모습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모 게임에선 이름을 비싼 값에 거래하기도 한다.) 도열이네 부부가 곧 태어날 아이 이름을 짓기에 열중하는 것도 그렇다. 이젠 나는 나에게 물어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나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을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명명이란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이름(名)에는 저녁 석(夕)자 밑에 입구(口)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름을 환하고 밝은 상태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짓, 손짓, 발짓 따위로 통하는 곳에서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해가 기울고 저녁이 되면 동네 아이들의 목청이 높아집니다.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마을 어귀가 가득차지요. 이렇게 어두울 때,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의 명명에 의해서 의미를 되찾습니다.]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 김형수
이름은 불리워지고 의미를 되찾아나가는 과정이라 했다. 호명을 지나 사랑을 가지고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명명되는 이름. 내가 다른 이들의 기억 속에 퇴색되어 갈 무렵 떠오를 이름. 내 스스로 노인으로 눈빛을 잃어갈 어두운 삶의 저녁의 때에 산티아고처럼 다시 바다로 나아갈 믿음을 만들어낼 이름이다.
나는 아이들에게도 묻고 나에게도 계속 물으며 갈 예정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그라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면 '안다'며 판단을 멈추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렇게 관계와 사랑은 서로에게 이어지며 삶을 예술로 만들어 나갈거다. 불러주고 의미를 만들어주며 서로를 기억해주어야 한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지?"라고 말이다.
마지막으로 도열이네 곧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이름이 선사되길 소망해본다.
-소낙비 코치 드림






